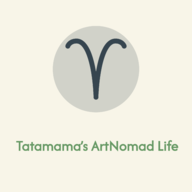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이배와 이우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침묵의 미학’을 확장해 온 두 거장이다.
검은 숯과 흰 여백—두 작가의 화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사유, 그리고 동양적 세계관이 층층이 쌓여 있다.
이배의 숯은 불타오른 뒤 남은 생의 잔향이다. 그는 태움과 쌓임의 과정을 통해 존재의 흔적을 반복적으로 기록한다. 반면, 이우환의 점과 선은 ‘비움’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여백 속의 대화를 느끼게 한다.
이 글은 이 두 세계를 잇는 ‘동양성’, ‘명상’, ‘흐름’의 개념을 따라가며,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적 정체성과 현대적 보편성을 결합하는지를 탐구한다.
겉으로는 닮아 있으나, 내면은 전혀 다른 두 작가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동양적 현대미술’이 단일한 미학이 아니라, 다양한 사유의 결을 품은 열린 언어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양성: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이배와 이우환 모두 동양적 사유에 기반하여 작품을 전개하지만, 그 사유가 구현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배는 흑과 백의 명확한 대비를 통해 내면 세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가이다. 그는 물감 대신 ‘숯’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화면 위에 수백 번, 때로는 수천 번에 이르는 덧칠을 반복한다. 이 행위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비움’, ‘무위’, ‘여백의 미’를 물질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숯은 생명이 불태워진 후 남은 재이며, 동시에 정화된 자연의 물질이다. 이러한 숯을 화면 위에 쌓아가는 이배의 방식은 단순히 시각적 결과를 넘어서, 시간과 기억, 소멸과 재생의 과정까지 담아낸다.
동양 사상에서 ‘여백’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무언가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케 하는 틀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이배는 여백을 숯의 덧칠과 농담의 차이로 표현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여백에 사유를 투영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표현을 넘어, 동양 철학의 시각적 구현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우환의 작업은 훨씬 더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동양성을 풀어낸다. 그는 ‘관계항(Relatum)’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며, 점, 선, 여백이라는 최소한의 요소들로 우주적 조화를 표현한다. 이우환에게 있어 동양성은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점 하나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그의 회화는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두 작가는 모두 동양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배는 물질성과 반복을 통해 사유를 드러내고, 이우환은 공간과 개념을 통해 동양의 철학을 풀어낸다. 전통을 직관적으로 물질화한 이배의 접근과, 철학적 추상으로 확장한 이우환의 접근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공통적으로 동양 미학의 현대적 해석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양성’이라는 공통 키워드 아래에서도 그들의 표현 방식은 뚜렷하게 갈라진다.
명상: 침묵과 반복의 예술
이배와 이우환의 작품 세계에서 명상적 요소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다. 이배는 캔버스 위에 숯을 바르고 또 바르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제작의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며, 동시에 내면의 침잠을 상징하는 명상의 과정이다. 그의 화면은 마치 수도자가 하루하루 수행을 기록하듯, 반복을 통해 축적된 ‘의식의 흔적’이다. 이배의 작업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다.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되지만, 덧칠과 반복을 통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장된다. 그 결과 화면은 ‘완성된 이미지’라기보다는 ‘과정의 단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반복은 관람자에게도 묘한 감정을 유발한다. 멀리서 보면 단순해 보이는 그의 검정 화면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수많은 층과 질감, 붓자국을 드러낸다. 이때 관람자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으로 느끼는 사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명상이 가진 본질, 즉 ‘내면을 바라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이우환의 명상은 이배와는 다른 결을 갖는다. 그는 ‘점 하나, 선 하나’를 그리기 전에 오랜 시간 머뭇거리고 침묵한다. 그의 명상은 ‘반복’보다 ‘기다림’에 가깝다.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이 중요하며, 그 한 점이 남기기 전의 시간, 그리고 그 후의 여운을 중시한다. 이우환은 이 순간을 ‘사건’이라 부르며,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요히 준비한다.
이처럼 이배는 ‘반복’을 통해 명상을 구현하고, 이우환은 ‘순간의 발생’을 통해 명상을 실현한다. 이배의 명상이 축적적이라면, 이우환의 명상은 단절적이고 순간적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관람자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전달하며,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이 점에서 두 작가는 다르지만 닮아 있다. 명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혀 다른 언어로 접근한 셈이다.
흐름: 시간과 공간의 언어
흐름은 이배와 이우환의 작품에서 중요한 키워드다. 이배는 숯이라는 재료를 겹겹이 덧칠하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쌓아 올린다. 그의 작품은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눌러 쌓인 ‘시간의 풍경’이다.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며, 그 모든 시간이 붓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검정은 단지 색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감정, 기억, 에너지의 결정체다.
이배의 흐름은 '시계적'이다. 즉,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축을 따라 움직이며, 그 안에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다. 그 흐름은 느리지만 깊다. 물질의 시간성, 작업의 반복성, 감정의 층위가 중첩되며, 하나의 작품 안에 수많은 흐름이 교차한다.
이우환은 이 흐름을 다르게 해석한다. 그의 흐름은 ‘공간과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점과 선은 공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여백과 긴장감을 통해 서로를 설명한다. 흐름이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의 순환이며, 보는 이가 느끼는 감각의 리듬이다. 그의 작품은 정지된 화면 같지만,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점과 점 사이, 선과 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우환의 흐름은 시각적 움직임이 아니라, 인식의 흐름이다. 그의 작업은 관람자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이 점은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선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의 사유도 함께 흐른다. 이우환은 시각보다는 ‘인지’와 ‘관계’를 통해 흐름을 유도하며, 이는 전통적인 동양의 ‘기(氣)’ 개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배의 흐름은 축적과 시간의 흐름이며, 이우환의 흐름은 긴장과 공간의 흐름이다. 둘 다 ‘흐름’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차이는 그들의 철학, 작업 방식, 감정 표현에 이르기까지 깊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점에서 두 작가의 비교는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결론
이배와 이우환은 모두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로, 동양 철학을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한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배는 물질성과 반복, 축적을 통해 사유를 드러내는 반면, 이우환은 공간과 관계, 순간을 통해 철학을 제시한다. 이들의 차이는 곧 동양성, 명상, 흐름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만약 현대미술 속 동양적 사유의 깊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배와 이우환의 전시를 직접 관람하며 그 차이를 몸으로 느껴보길 권한다. 그림이 아닌 사유를 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