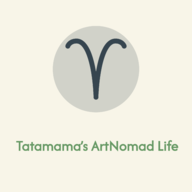AI가 이미지를 만들고, NFT가 예술의 가치를 거래하는 시대—
그 속에서 한 예술가는 여전히 한 화면 위에 선을 긋고, 또 긋는다.
박서보, 한국 단색화의 상징이자 ‘묘법(描法)’의 창시자.
그의 붓질은 색을 칠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존재를 새기는 수행이다.
박서보의 화면은 단순히 한 가지 색의 반복이 아니다.
거기엔 동양의 사유가 있다 — 비움으로써 채우고, 멈춤 속에서 흐름을 찾는 마음의 리듬.
그의 묘법은 철저히 육체적이지만, 동시에 명상처럼 정신의 행위이기도 하다.
이 반복의 미학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느림과 집중의 언어다.
이 글은 박서보의 묘법을 중심으로, 반복이 어떻게 예술이 되고, 수행이 어떻게 창조로 변모하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묻는다.
기계가 예술을 흉내 내는 시대에, 인간의 손이 여전히 남길 수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
반복은 단순하지 않다: 묘법의 시작
‘묘법’은 단순한 붓질의 반복이 아니다. 박서보는 하루에 수백, 수천 번의 선을 그으며 "무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 행위는 마치 수도승이 염불을 반복하듯, 붓질을 통해 사사로운 욕망을 비워내는 수행 그 자체였다.
묘법의 시작은 1970년대 초, 박서보가 내외부적인 한계에 봉착했을 때였다. 그는 당시의 추상 표현주의에 회의를 느끼며, 감정의 발산이 아닌 침묵의 사유로 전환한다. 그 전환점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묘법이다.
작가는 연필로 그은 선을 따라 한지를 덧입히고, 안료를 채우며 반복한다. 그 과정은 기계적이지 않으며, 날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를 품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결코 같은 결과는 없다. 이 미세한 차이는 생명력이며, 바로 인간의 숨결이다.
이처럼 박서보의 묘법은 반복을 통한 해탈이며, 시간의 축적이다. 그것은 형식이 아닌 철학이다. 묘법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붓을 드는 이유’를 예술 그 자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철학과 묘법: 무위(無爲)의 예술
박서보는 묘법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행위"라고 말한다. 이는 동양철학의 핵심 개념인 무위자연(無爲自然)과도 깊이 닿아 있다. 인위적 창작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억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비움으로써 본질에 다가가려는 태도다.
그의 캔버스는 텅 빈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 번의 반복, 수천 겹의 의식적 ‘무의식’이 쌓여 있다. 박서보는 이 과정을 통해 ‘나’라는 작가가 점점 사라지고, ‘자연’이라는 본질이 전면에 나오게 된다고 말한다.
동양에서는 예술이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박서보에게도 작업은 곧 일상이고, 일상은 수행이며, 수행은 예술이었다. 그는 작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기 때문에 붓을 들었다. 이러한 관점은 서구 현대미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서양이 감정과 표현에 무게를 둔다면, 동양은 절제와 침묵을 통해 본질에 접근한다.
묘법은 이 같은 동양적 사고의 결정체다. 박서보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다. 감정을 ‘넘어서려’ 한다. 감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묘법의 힘이며, 예술이 삶에 닿는 방식이다.
박서보 예술의 현재적 가치
2020년대, 예술은 기술을 통해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생성형 AI, NFT, 디지털 아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인간의 창작’은 도전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서보의 묘법은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AI는 형식과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지만, 묘법의 본질인 ‘과정’은 따라 할 수 없다. 묘법은 반복된 붓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작가의 내면과 세계를 연결한다. 이 과정은 데이터를 조합하는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창작이다.
또한 박서보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며, 묘법을 멈추지 않는다. 그에게 예술은 전시나 결과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묘법은 단색화의 종결이 아닌 확장이며, 고전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2020년대 초, 그의 작품은 뉴욕, 파리, 런던 등지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지 작품의 시장 가치 때문이 아니다. 묘법은 글로벌 미술계가 다시 철학과 사유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박서보는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시대의 질문에 묵묵히 답해왔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전히 유효하다. 묘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결론: 묘법은, 곧 박서보다
박서보는 자신의 예술을 위해 특별한 언어를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같은 붓을 들고, 같은 선을 그리고, 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냈다. 묘법은 한 작가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자 예술이며, 삶의 흔적이다. 그것은 감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침묵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머무르게 한다. 이 시대에 박서보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그의 예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